대안없는 비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원칙 중 하나가 '대안 없는 비판은 비난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에 조사된 자료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안 없는 비판을 직장에서 가장 짜증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역시 너무나 이상적으로 들리는 이 말을 오랫동안 일종의 물리학 법칙처럼 항상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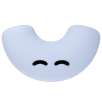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원티드에 가입해 주세요.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1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