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를 움직이는 평가: MZ세대에게 주파수를 맞춰라!

.평가보상의 기준 = 조직의 방향.*기업의 평가보상은 가장 어려운 HR의 숙제입니다. 상공회의소 조사(2017년 7월)에 따르면 직원들의 75%는 평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가를 받고 오히려 45%는 의욕이 꺾였다고 응답합니다. 사실 평가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유쾌하거나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유쾌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구성원을 동기부여하고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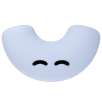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원티드에 가입해 주세요.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