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슐랭 가이드(2) - 웰니스 복지 핫플을 찾아서 : 마이크로소프트
인살롱
인살롱 ・ 2021.08.24

.업폴의 <웰슐랭 가이드: 웰니스 복지 핫플을 찾아서>는 웰니스 개념을 복지 문화의 근간으로 채택한 기업, 혹은 웰니스 복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을 전격 해부해보는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웰슐랭 소개.
오늘 소개해 드릴 웰니스 복지 핫플은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이하 MS)입니다..ca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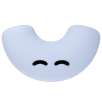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원티드에 가입해 주세요.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인살롱
인살롱함께 보면 좋은 인살롱 콘텐츠
시절이 시절이라...HR에게 더욱 필요할 '공감능력'
들어가며. 딱히 원티드가 마감을 독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속한 날짜의 자정 전에는 원고를 올려온 바, 그러니까 나름의 마감을 앞두고 불꽃 집필을 한 후에, 쓴 글을 모두 날려 먹고 새로 쓰는 그 참담한 심정을..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만리장성 인터넷의 벽 앞에서 통곡하며...한번 더 쓰는 글이라는 걸 미리 알리며..아마 공감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된거죠 뭐.
한국인만 빨리빨리를 외치는 줄 알았더니, 중국 시장도 놀라운 수준의 속도경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모바일 생태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온라인 커머스의 배송경쟁이 30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넓은 땅에서. 경제성장 속도도 가팔라서인지 일자리가 (과장 조금 보태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채용시장도 그에 발맞춰 연봉과 타이틀 경쟁이 매우 심화된 양상입니다. HR에 몸 담고 있는 동료분들도 이런 속도에 익숙해져서인지, 다들 최단 시간 내에 HRBP가 되고 HRD가 되는데 큰 관심을 두는 모양입니다.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HRBP에서 CoE로 돌아온 이유가 뭐야?" 처음에는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도 모르고 주절주절 더듬더듬 답변 하였는데, 알고 보니 'HR Generalist 로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삼천포로?' 와 같은 질문인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저도 HR을 시작하던 시절에 '10년 안에 HR Business Partner가 되어야지'와 같은 목표 같은 게 있었으니, HRBP가 HRD가 되는 전초 단계의 어디쯤으로 여겨지는 건 어디나 비슷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열과 순서를 가리는 일이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HRBP가 되는 일. 혹은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좋은 HR BP가 되는 일은 '수학의 정석'같이 한 가지 답이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많은 분들이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나름으로 정리 해본다면, 결국 이것도 파트너라는 이름이 붙은 이상 상대방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해관계자와 어떤 파트너십을 맺는가로 결국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파트너십은 사실 저마다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의 역동성(Dynamism)'에 기대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딱 뭐다…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래도 억지로 뭐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정리하면, HR BP가 되는 일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HR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두루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어떤 분들은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뢰를 얻어 가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과 관련한 밀접정보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 가기도 하죠. 제 HR BP 경력 중에서 얻은 하나의 통찰을 공유하자면, 결국 비즈니스 상대방이 나를 믿고 신뢰할만한 대화의 상대로 여기는가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HR관련 논의를 깊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사실 조직이나 회사 내에서 시니어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리더들은 참 외로운 존재입니다. 사실 회사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 현안에 대한 이슈나, 사람때문에 벌어지는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공감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리더들은 더더욱.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그걸 말하고 공감받기 위해서는 사실 상황과 맥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대화 나누고 설명된 사이가 아니고서야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공감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매일매일 여러가지 비즈니스의 도전과제와 사람관련 이슈를 다루는 리더들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 놓고 이해와 공감 받는다는 건 매우 드물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괜찮은 HRBP가 되기 위해서는 경청" 과 " 공감이 기본 능력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HRBP를 비교적 시니어 HR이 담당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쉽게 한두해에 만들어 지는 건 아니니까요. 경청과 공감을 이야기 하면서 AND 조건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청은 공감에 이르는 첫 걸음이어서도 그렇고, 경청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이 필수로 발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영어로 말하면 vice versa 같은 관계인 것입니다.흔히들 경청에는 3단계의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1단계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경청을 의미합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경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조에 지나지 않게 되거나 말하는 사람의 진짜 의도나 노력을 간과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 함몰되어서 상황과 사정을 올바로 바라보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단계 경청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문제를 과소평가 하거나, 과대평가 하거나, 해결하려 하거나, 충고/조언/평가/판단 하려고 하는 경향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런 경청이 상대방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리는 만무하죠. 3단계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가 모두 관찰되고 두루 살펴지는 형태의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대화와 경청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3단계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만들어 낸 말이 아니라, 제가 몸 담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시는 남관희 코치님이 해 주신 말씀입니다.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화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식과 노력이 뒷받침 된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공감을 하나의 삶의 방법이자 자세로 취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훈련에서 아주 모범생이 아니라서 선생님 말씀을 정확히 정리했는지 약간 염려도 되지만, 아무튼 공감도 훈련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는 메시지 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보면, 공감이 주는 힘과 그 힘이 만들어 내는 치유의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업무의 현장에서 HR이 비즈니스파트너링...한다는 게 결국은 공감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업무를 계속 해 나가고 이 회사에 계속 다닐 이유 하나쯤을 만들어주는 것 아닐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람 하나 살렸다, 그걸로 보람 된 하루였다’하고 말이죠. 사실 HR 모두가 지금의 시대에 가장 주의깊에 관심가지고 Upskilling 해야 할 영역이 바로 공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코로나가 일상에 만연하고, 당연했던 것들과 그렇지 않았던 것들의 경계가 속절 없이 무너지는 걸 매일 목격하면서 미치기(Insane)보다 미치지 않기(Sane)이 어려운 시대에, HR이 회사 안에서 발휘해 주어야 할 역할 중 가장 큰 부분이 경청과 공감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앞으로의 HR에게도 가장 필요한 개발 포인트고요.그래서 돌아 돌아 남보다 빨리 HR Business Partner 가 된 중국의 몇몇 동료들을 보면,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파트너가 되었다기 보다는 HR 관련 의제에서 Communicator/Liaison/Representative 역할 정도를 겨우 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공감이 만능 수퍼파워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으려나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짐작합니다. 그럼 결국 시간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라고 챌린지 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익숙한 네트워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회사 내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귀를 기울이고 이들에게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는 노력이 꾸준히 된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내 업무 바깥의 사람들에게 꾸준히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는 HR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보이는 건 그저 저만의 느낌적 느낌이길...
인살롱 in 인살롱 ・ 2021.08.23 Dark side of HR 4탄 – 전임자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리더들
“Though we don’t live in the past, we live with the past”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 함께 살고 있다. 과거의 경험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판단에 대한 정보를 주고,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HR에서 다루는 모든 영역이 이에 해당되겠지만, 가장 크게 와 닿는 부분은 바로 리더십이다. 리더십만큼 대조 효과(Contrast effect theory)가 크게 발생하는 영역이 있을까? 전임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에 따라 후임 리더의 리더십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전임 리더가 탁월할수록 후임 리더의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전임 리더가 워낙 소문난 X라이라서, 그냥 평범하고 정상적이기만한 누군가가 부임하면 상대적으로 뛰어난 리더로 인식되기도 하는 등)
과연 정말일까?
미국과 홍콩의 5명의 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 한 중국 서비스 기업이 최고 경영층의 지시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하는데, 중국 전역 28개 지부의 리더 교체를 단행하였다. 이때, 4주간 리더 승계를 경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임 리더와 후임 리더의 리더십 평가(여기서는 변혁적 리더십 측정문항을 사용함)를 측정하였다.어려운 얘기는 넘어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임 리더의 리더십이 신임 리더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신임 리더의 리더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학자와 미국학자가 함께 기술하여서 그런지, 필자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여 그런지, (아마도 후자이겠….ㅜ) 아티클의 영어가 매우 길고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결국은 그림 2장과 표 1개만 이해하면 된다.전임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낮을 때 신임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은 더 강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종단으로 연구하였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 끝(feat. 오진혁 선수). (한 껏 폼을 잡아 보지만, 슈퍼맨 같은 전임리더의 그림자 속에 평가절하 당할 수 있는 신임리더들) 꼭 리더십 분야가 아니더라도 인간이 과거의 경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여러 학자들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경험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데 비교를 위한 기준이 됨(Frederick & Loewenstein, 1999: Markman & McMullen, 2003)
사람들은 경험적인 것을 이용하여 새로 나타난 다른 것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함(Andersen & Chen, 2002 Bargh, Chen, & Burrows, 1996)
이제 전임리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그렇다면 HR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할까?**크게 4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첫째, 신임리더의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전임리더의 리더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인물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의도적인 시련(deliberate challenging) 부여가 아닌,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의 Talent Management를 한다면 조직 개편 시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둘째, 리더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조직문화 진단 결과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고 무작정 변화된 리더십이 원인인 것으로 주홍글씨를 찍기 전에 전후 맥락을 파악해보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임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리더십 진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리더 개인에 대한 가치관 진단 등을 통해 ‘리더’이자 ‘사람’인 그의 고유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자.셋째, 리더십은 역할이다. 동일한 조직이라도 각각의 포지션에 맞는 기대 역할이 존재한다. (ex. 재무담당 임원과 생산담당 임원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다르듯) 획일적인 리더십 역량의 잣대(프레임)로 보면 전임자와의 비교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정작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찰하기 어렵다. 리더의 Personality와 조직의 기대 역할이 조화를 이루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넷째,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말자.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며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다. 당연히 리더 혼자만 노력해서는 달성하기 요원하다. 리더와 구성원이 같은 땅을 밟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험난한 여정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원이 필요하다. 안 그래도 힘든 이 시대 리더들에게 어설픈 리더십 역량 프레임으로 시작부터 의욕을 꺾어 버리지 말자.우리는 과거와 함께 살고 있지만, 과거를 위해 사는 것은 아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미래를 향한 도전적인 걸음이 필요하다.
지난 글 보기>Dark side of HR 1탄 – 이제 신입사원 조직전력화는 버려라Dark side of HR 2탄 – 심리적 안전감이 오히려 조직을 망칠 수도 있다Dark side of HR 3탄 – 조직침묵(Organizational silence) 다음 글 예고>Dark side of HR 5탄 – 역량모델, 이제는 그만 놓아주자. . 참고문헌Andersen, S. M., & Chen, S. (2002). The relational self: an interpersonal social-cognitive theory. Psychological Review, 109(4), 619-645.Bargh, J. A., Chen, M., & Burrows, L. (1996). Automaticity of social behavior: Direct effects of trait construct and stereotype activation on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230-244Frederick, S. & Loewenstein, G. (1999). Hedonic adaptation. In Kahneman, D., Diener, E.D., & Schwatz, N.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 302-329).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Liberman, V., Boehm, J. K., Lyubomirsky, S., & Ross, L. D. (2009). Happiness and memory: Affective significance of endowment and contrast. Emotion, 9(5), 666.Markman, K. D., & McMullen, M. N. (2003). A reflection and evaluation model of comparative thin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3), 244-267.Zhao, H. H., Seibert, S. E., Taylor, M. S., Lee, C., & Lam, W. (2016). Not even the past: The joint influence of former leader and new leader during leader succession in the midst of organizational chang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1(12), 1730.모든 이미지 출처: https://pixabay.com
인살롱 in 인살롱 ・ 2021.08.23 조직행동, 지각과 의사결정
1. 개요
‘개인행동’ ‘집단행동’ ‘조직시스템’ 총 3부로 나눠져 있는 조직행동론에서 ‘지각과 의사결정’은 ‘개인행동’ 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다. 그 까닭은 의사결정은 윤리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조직 내 리더는 ‘바람직한 선택 또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지각(perception)’과 관련이 있다.
‘지각과 의사결정’ 학습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지각 요소와 귀인이론,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지각 오류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2. 지각 perception
지각은 ‘주관적 해석(의견 · 느낌)’으로 단순하게 말할 수 있다. 학문 정의는 ‘사람들이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감각적 인상을 조직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컨대 ‘루빈의 잔’은 같은 대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지각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지각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행동은 ‘주관적 해석’에 의한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이기 때문이다. ‘사람’이라고 지각한 것을 ‘말’하는 것은 ‘의사결정’이라는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 보면, 미국 경제전문지 <포츈(Fortune)>은 매년 ‘
The 100 Best Companies to Work for(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선정 발표한다.
이는 대표적인 ‘주관적 해서’으로 ‘지각’의 사례다. 사람은 객관적인 실체 보다는 ‘자신이 ‘진(眞)’으로 해석한 것에 호의적으로 행동(여기서는 설문에 응답하는 것)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00대 기업이 일하기 좋은 기업인지 여부 보다는 ‘그 기업은 일하기 좋은 기업이다’라고 믿음에 한 표를 찍는 다는 것이다.
무엇이 설문자의 지각에 영향을 미쳤을까.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①지각의 주체(perceiver) ②지각의 대상(target) ③상황(situation)이 있다.
①지각의 주체(perceiver)란 ‘개인은 어떤 대상을 보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 때 개인의 태도, 성격, 동기, 관심, 과거 경험, 기대는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개인의 특성’이 ‘대상’을 다르게 지각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2016)’는 어벤저스 팀을 UN의 하부기관으로 하는 ‘소코비아 협정’에 대한 ‘지각(주관적 해석)’이 달라, ‘찬성하는 캡틴 아메리카 팀’과 ‘반대하는 아이언 맨 팀’으로 나눠 싸우는 것이 줄거리이다. ‘캡틴 아메리카(크리스 에반스)’와 ‘아이언 맨(로버트 다우 주니어)’의 서로 다른 지각이 이 영화의 발단인 셈이다.
②지각의 대상(target)이란 ‘조용한 사람’보다 ‘크게 떠드는 사람’이 쉽게 눈에 띄듯이 지각의 대상이 지닌 특성이 개인의 지각(주관적 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영화 ‘미녀와 야수(2017)’에서 주인 공 ‘벨(엠마 왓슨)’은 ‘야수’를 전혀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지각의 대상인 ‘야수’가 ‘벨’의 지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야수와 달달한 사랑을 뿜어 내고 있다. 야수를 본 대다수의 사람은 도망치거나 겁에 질려 기절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다.
왜 그럴까? 이는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에서 다루겠지만, 야수에 대한 벨의 행동은 ‘지각 대상(야수)’의 특성에 영향을 받았다기 보다는 벨 자신의 ‘내면의 동기(‘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동기)’가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③상황(situation)이란 ‘지각 대상과 배경과의 관계가 지각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상황의 요소들,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시간, 직무여건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테면 조명(1차 호손 실험), 온도(날씨)는 모두 지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다.
상황이 지각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영화에서는 감동적인 장면을 만든다. ‘아마겟돈(1998)’의 마지막 장면 주인공 해리(브루스 윌리스)는 AJ를 대신해서 폭탄을 들고 지구로 돌진하는 행성에 남는다. “이젠 내 차례다!”(
https://youtu.be/oHyc6-Hq1tk
2분 8초 시점)라고 말하고 떠나는 주인공 해리는 ‘상황 지각’에 따른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각에 영향을 끼치는 ①지각의 주체(perceiver) ②지각의 대상(target) ③상황(situation), 이 세 가지 요소는
‘조직 내 개인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은 최고경영자와 리더에게 전하는 시사점이 있다. 하나는 개인의 지각은 현실과 분명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고경영자와 리더는 이 ‘차이’를 만드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직무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개인은 결근을 자주하거나 급기야 이직을 한다.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 들일 수 있지만, 만약 ‘부정적인 지각’을 갖게 된 과정에 ‘왜곡’이 있었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왜곡은 없었는지’라는 의심은 최고경영자와 리더의 ‘문제 해결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
이를테면 ‘왜곡된 원인’을 찾는 노력은 ‘문제 정의’의 수준을 결정하고, ‘문제 정의’의 수준이 ‘왜곡’을 없애기 위한 ‘행위의 강도’를 (의사)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각의 수준은 최고경영자와 리더의 의사결정의 질적 수준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지각을 의사결정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살롱 in 인살롱 ・ 2021.08.23 임파워먼트(empowerment) 다시 보기
주로 해외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원격근무는 비즈니스의 특성이나 전략 등에 비추어 검토되거나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원격근무는 COVID-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영향을 받아 떠밀리듯 시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국내의 경우 원격근무 도입 당시만 해도 조직차원의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시간의 부족과 구체적인 방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원격근무를 위한 조직 구성원들의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어색함과 혼란 등이 발생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행된 원격근무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상대적으로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 중에는 기성세대 리더들도 있다.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해왔던 것에 대한 익숙함이 시대사회적 상황, 세대, 근무형태 등의 변화에 대한 적응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할 필요도 있다. 불가피하게 시행된 원격근무를 경험한 구성원들 중 주로 Z세대의 긍정적인 반응을 포함하여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유연근무제, 업무의 효율성 부각 등에 힘입어 앞으로 원격근무는 사무실근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근무형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리더들이 다시 들여다봐야 할 개념이 있다. 바로 임파워먼트다. 임파워먼트는 1940년대를 기점으로 정치학과 사회학의 분야에서 먼저 출발한 개념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할 권한을 위임하다’, ‘할 수 있도록 하다’, ‘할 능력을 주다’, ‘에게 허용하다’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경영이나 리더십 측면에서 수행된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물리적으로 구성원에게 리더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넘어 구성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 및 조직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업무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권을 갖게 하여 자신감을 높여주고 자신의 직무능력 향상과 함께 자신의 일을 스스로 수행함으로서 느끼는 성취감과 즐거움 등을 줄 수 있다. 또한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직장과 자신이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고 자신의 일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강한 사명의식을 갖도록 해주기도 한다. 아울러 개인적인 측면에서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수 있으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물론 임파워먼트는 단편적인 교육이나 선언 등과 같은 활동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리더와 구성원간 신뢰 형성이다. 특히 리더는 조직의 각 구성원 모두가 더없이 소중하며 조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한다. 구성원 역시 리더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이는 신뢰가 없는 임파워먼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일하는 방식과 사람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통제나 관리를 통한 접근에서 벗어나 조화, 통합, 촉진 등과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구성원에 대한 시각도 X론에서 Y론으로 바꿔져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오늘날 우리의 조직이나 업무환경이 과거와 같이 조정경기가 아니라 급류타기로 변했다는 것은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직ㆍ간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임파워먼트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진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직은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임파워먼트에서 다루는 힘(power)은 Zero-Sum이 아니라 Positive-Sum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임파워먼트가 현장에 힘을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해 본 적이 없어 못할 것 같다는 것은 이유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임파워먼트 된 조직과 구성원들을 상상해보면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인살롱 in 인살롱 ・ 2021.08.25 성장하는 조직을 위하여(1) - Growth Mindset을 가진 사람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의 건강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조직이란,
“Sustainability refers to the ability of a company to survive and succeed in a dynamic, competitive environment”
변화무쌍하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말한다.
변화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 하에서, 시장 흐름에 맞닥뜨려 도전을 견뎌내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사담당자로서 처음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 또 사람이다.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성장하고 살아남기 위한 조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다.
이번 기고에서는 **개인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Growth Mindset(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고찰해보고자 한다.
Growth Mindset 이란 무엇인가.
**Growth Mindset(성장 마인드셋)**은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Carol Dweck 박사가 2015년 그녀의 저서, .
Mindset: New Psychology of Success
.에서 저술한 개념으로
타고난 재능에 국한되지 않은 헌신과 노력을 통한 개인의 성장
본인의 배움에 대한 사랑
큰 성취를 위한 개인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며,
Growth Mindset을 가진 구성원은 조직 내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동기부여하고, 과정을 혁신하고 생산성과 성과를 향상시킨다.
이 개인행동이 반복되면, Growth Mindset을 가진 구성원은 팀 리더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성과 기대와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고, 팀원들과 협업을 원활히 하며, 정보공유와 소통을 원활히 한다.
나아가 조직의 내외부 환경변화에도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 전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부 핵심인재로서 자리매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경영진들은, 리더들은 무엇보다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을 가진 인재확보와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고정 마인드셋(Fixed Mindset)**이라는 개념이 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특질은,
재능(talent)와 지능(intelligence)는 타고난 것이다.
사람은 향상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 (예) 축구는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거야. 난 여자라서 수학을 못해.)
본인의 한계에 의해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정해져 있다. (예) 내가 그 회사에 불합격한 건 당연해.)
도전을 피하고 쉽게 포기한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로 정의된다.
이러한 조직에서 두가지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아래와 같은 도식으로 발현이 되는 경향을 가진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즉 자신이 믿는대로 행동하고, 스스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면 올바른 성장마인드셋이 발현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오해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사람의 가장 흔한 오해는 단순히 “언제나”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두 가지 마인드셋(Two mindset)을 모두 가지고 있다. 누구나 혼합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비중과 경험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하고 성장한다. 고정적인 특질이 발현하더라도 스스로 추구하는 목표에 집중하고, 이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야 한다.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는 있을 수 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미리 인정해 버려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하는 것을 스스로 막지 않는다.
과정에 집중한다.
결과에 천착하는 데 집중하게 되면, 단기적인 목표와 개인의 성장에 해를 입힌다. 과정에 집중하고, 학습과 발전의 과정에서 오는 결과에 기뻐한다.
성과를 내야하는 조직의 목적 상 이는 언제나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스스로 피드백하고, lesson learned를 연습하고 실천한다.
좋은 결과가 온다는 믿음이 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직과 팀, 동료, 나 자신 모두가 건강한 피드백과 영향을 주고받을 때 노력에 대한 성과를 보상받는다는 믿음을 쌓아가야한다.
절대 단기적인 인정과 보상(recognition and reward)제도가 될 수 없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화 해야만 한다.
개괄적으로 살펴봤지만, 실제 조직 내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섬세하고 집중적인 관찰을 통한 세부적인 가이드 도출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주변 환경에 따라, 현재 상황에 따라 스스로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한다. 따라서 어려움에 놓이거나, 비판을 받거나, 남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너무 보잘 것 없다고 느껴질 때 쉽게 불안감이나 자기 방어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혹은 우리의 환경이, 회사가, 팀이, 고정된(fixed) 사고방식에 빠져있을 수 있다.
과도한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구성원들이 정보공유, 협업, 건강한 피드백, 스스로에 대한 오류 개선, 혁신 등의 성장마인드셋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 무시하게 만든다.
“The best thing a human being can do is to help another human being know more.”
— Charlie Munger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른 인간이 더 많이 알도록 돕는 것이다."
인살롱 in 인살롱 ・ 2021.08.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