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가 먹고 싶은 걸 시킨다 [김소진의 커리어칵테일]
“아, 뭘로 고르지? 둘 다 맛있어 보이는데.”
파트너사들끼리 만난 식사자리에서 한 여자 팀장이 봉골레 파스타와 토마토 파스타를 두고 고민했다.
“얼른 골라. 다들 기다리잖아.”
옆에 앉은 그의 상사가 살며시 핀잔을 줬다.
“네. 그럼 토마토로 할게요.”
여자 팀장이 고심 끝에 토마토 파스타를 시켰다. 하지만 봉골레를 향한 아쉬운 눈빛도 채 거두질 못했다.
잠시 후 주문한 메뉴가 나왔다. 하지만 여자 팀장은 토마토 파스타가 기대한 맛이 아니었는지 표정이 밝지 않다. 그러자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최 팀장이 말을 걸었다.
“으… 봉골레 처음 시켜봤는데 제 입맛에는 안 맞네요. 팀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바꾸실래요? 제가 원래는 토마토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여자 팀장이 반색을 하더니 서로 접시를 바꾼다. 그리고 여자 팀장은 뜻밖의 행운에 감사하며 봉골레를 맛있게 즐겼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건 행운이 아니라 최 팀장의 배려라는 걸.
최 팀장의 주특기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 시키기이다. 음식점에 가든 카페에 가든, 그는 늘 상대가 좋아할 법한 메뉴를 시킨다. 그래서 두 가지 음식을 시키면 하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하나는 안전한 걸 시킬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혹 새 도전이 실패하면 적당히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시킨 안전한 음식을 상대에게 양보한다.
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 끼 정도 맛 없는 거 먹는다고 크게 문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랑 같이 있는 사람이 즐거운 게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맛이 까다롭지 않아서 보통 다 잘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는 건 결코 작지 않은 배려다.
최 팀장의 주특기가 하나 더 있다. 점심 두 번 먹기다. 그는 미팅 상대가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항상 물어보고, 안 먹었다고 하면 자기도 공복이라며 꼭 식사하러 가자고 한다. 방금 전 식사를 하고 왔으면서도 상대를 위해 또 함께 식사를 해주는 것이다.
최 팀장은 상대가 먹고 싶은 걸 시킨다거나 함께 식사를 해주는 등의 작지만, 결코 쉽지 않은 배려로, 늘 상대와 좋은 협업을 이끌어내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상대가 먹고 싶은 걸 시킨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음식점에서도 상대를 살펴라!
저작권자 © 뉴스앤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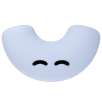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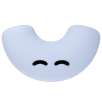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원티드에 가입해 주세요.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 1

원티드 에이전트개발・2024.07.09
김소진님의 글은 정말 따뜻하게 마음을 울리네요. 😊 최 팀장의 배려심이 돋보이는 멋진 이야기입니다.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