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때 90 중반이 되신 우리 할머니와, 100세 초반인 할머니 친구분의 대화를 들으며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번 회사 이직 때까지만 해도 ‘야근은 당연히 합니다’ 라는 태도였고, 야근을 많이 하는 (시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량도 어마무시했던) 사람임이 내 세일즈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야근을 꺼리지만 그걸 해내는 내가 열정이 넘친다고 스스로 합리화 하기도 했었다. 그래서인지 작년 8월 이후 반년정도 칼퇴는 커녕 출근한 당일에 퇴근하는 것도 드문 일이 되었고 업무며 사람이며 각종 스트레스 밑에서 터져나갈 듯이 압박 받고 있었다. 그런데 난 그걸 몰랐다. 그러다 작년 12월, 회사 건강검진 결과가 내 생활습관을 싹 고치도록 했다. 면역력과 체력과 근력이 떨어지며 재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각종 문제들이 발견됐다. 멘탈적으로도.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하나하나를 각기 다른 과목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공통적으로 권고 받는 사항이 ‘물 많이 잠 많이’ 였으니 아닌 게 아니라 원인이 제법 명확해보였다. 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내 건강을 자양분 삼아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그 뒤로 나는 바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충분한 쉼이 있는 저녁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보상심리처럼 잠을 줄여 사람들과 만난 시간, 술을 마시던 날들, 새벽부터 녹초가 될 때까지 돌아다니던 여행들에도 자연히 내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부가적으로 얻은 건 내가 내 삶과 나를 통제할 수 있고 내 상황을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안정감이 들었다는 것이다. 할머니들은 서로의 건강과 가족 관계들을 물으며 종내에는 ‘네가 살아있어서 내가 마음이 좋다’ 는 대화를 했다. 일도 커리어도 타인의 인정도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모두 건강히 살아서 누군가의 마음을 좋게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야근이 당연시 되지않고 개인의 삶과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가 얼른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아직도 ‘야근이 많은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그런 거 말고 내가 잘 하고 좋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런 의미 있는 것들로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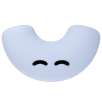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