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Part 3. 물결, 그리고 점. 성찰. 팔꿈치 책상에 올려 턱 한쪽 괴고 고민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안개가 짙게 낀 듯 막막해서 여기저기 질문했으나 "왜? 하며 깊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니 가운데 손가락 마디로 콩 한 대 때리고 싶었다. 뚜렷한 답이 듣고 싶었는데 일단 해 보라는 말들 뿐이니 다들 정답을 말해주기가 아까웠나 싶다.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사람들이 집어가는 책을 흘끔 보기도 하고 땡튜브 유명 강의를 들어보기도 하고. 딱 들어맞는 감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질문'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구불구불 비탈진 길을 참 어려워한다. 힘들이지 않고 발 디디기 쉬운, 도착 지점이 보이는 그런 길을 선호한다. 곧게 뻗은 직선과 이를 완결시킬 점 하나에 편안함을 느낀다. 느낌표처럼 말이다. 하지만 삶은, 똑 부러지는 해답으로 즐비한 것보다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다가 마침내 그 점에 안착하는 물음표가 제법 더 쓸모 있는 법이었다. 예를 들면 "나 이거 좋아해!"가 아닌 "나 이거 좋아해, 근데 왜?"가 필요하다는 거다. 눈이 향하는 곳으로 물음표를 던져 꽂을 것이 아니라, 다시 내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날려야 하는 것이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처럼. 딩동댕 하는 실로폰 소리가 울려 퍼질 땐 난제를 해치운 것만 같았는데 그저 순간에 불과했고, 또 다른 난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수두룩 빽빽했다. '나'라는 기준점이 없었기에, 매 시간 매 분 매 초 에너지 쏟아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려 끼워 맞추기 바빴기에 그리도 고되고 지친 기색이 완연했던 것이다. 고로, 자신을 이해하는 일만큼은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설사 꼬리에 꼬리를 물지 못하더라도 그 끝자락에 살짝 스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물음은 계속되어야 하며 끊기지 않아야 뿌리에 닿을 수 있다. 정해진 길은 어디에도 없기에, 앞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험난하고도 두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원점으로 헛걸음하는 날이 있더라도 파헤쳐야 하는 것이다. 울퉁불퉁하고도 거칠게 줄지어있는 물음표들을 만난다 해도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곧게 다림질해 가면 답은 틀림없이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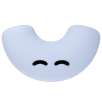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