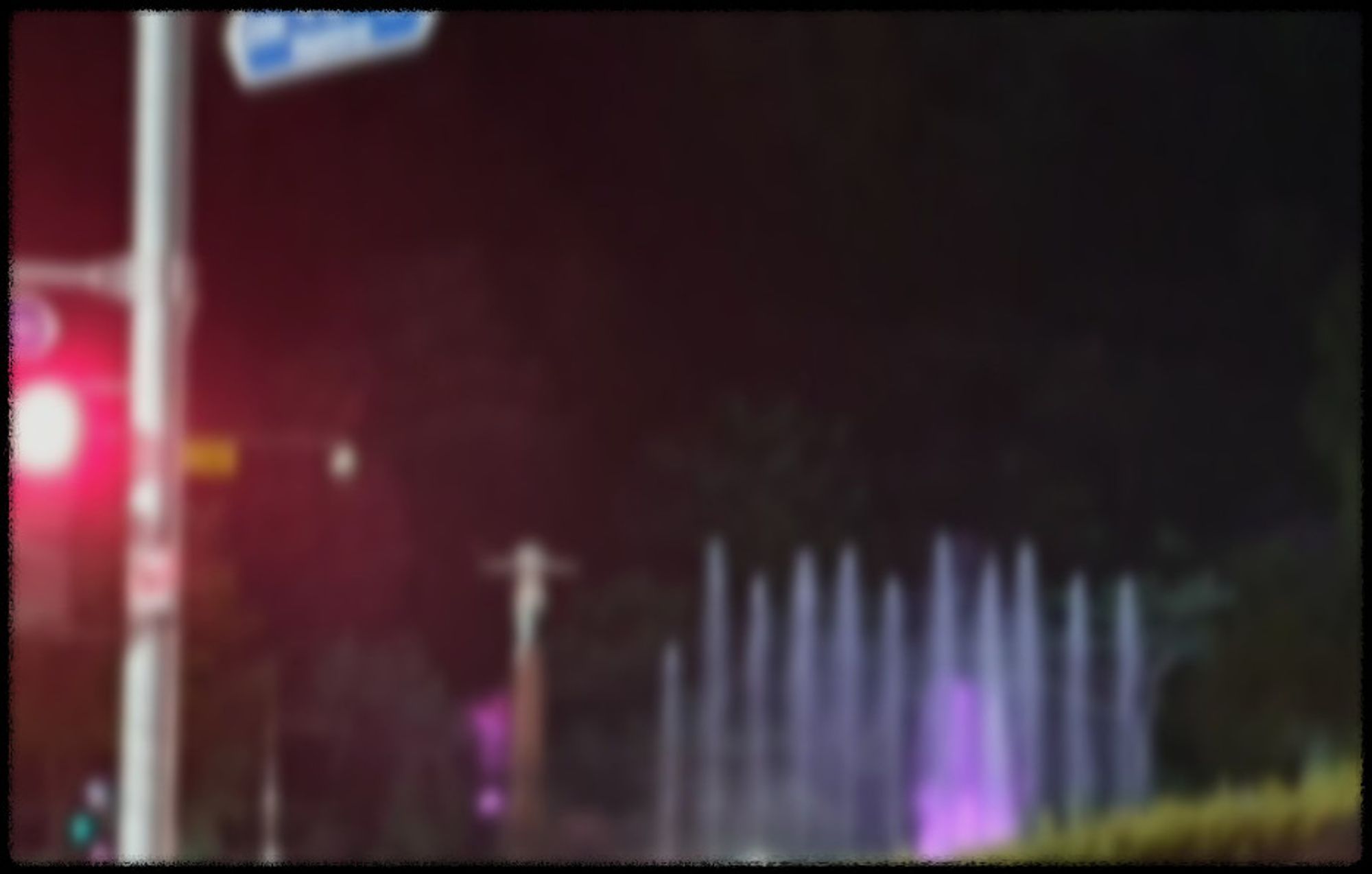
저녁 산책, 집 근처 어느 사거리. 어쩌다 보니 대략 20여분 정도를 더 돌아서 다다른 그곳 한쪽엔 아담한 공원이 있었다. 바로 사거리 옆인 탓에, 간간이 침범하는 차 소리가 달갑진 않았지만, 늦은 저녁, 나무, 돌길, 잔디, 달빛과 같은 배경에, 네댓 명 정도의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있거나, 가볍게 거니는 그곳의 분위기는 모자라지 않게 너즉했다. 그 한쪽에 있던 분수가 보인 것도 그즈음, 작은 동산에 업혀 회색빛 바위 조형과 소나무로 맵시를 꾸린 계곡과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분수는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이는 작은 연못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에 더해, 잔잔한 밤 조명과 어우러져, 보라색 주황색 파란색 ---, 다채로이 갖가지 색을 품은 그 물가닥들은 오르락내리락 솟고 지길 거듭했다. 적적하게 --- 그걸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언젠가 이렇게 공원에 앉아 분수를 같이 보던 날이 생각난다. 그날은 너의 처음.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것을 맡아 이끌어야 했던 너는 그 몇주 전부터 무척이나 마음 졸이며 불안에 시간을 실어 보냈다. 이미 본 것을 다시 보고, 다시 그리고, 다시 조율하며, 혹여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할까, 구성 간에 어울리지 않는 화음이 있지 않을까, 연신 걱정을 하면서 푹푹 한 숨을 쉬고 머리를 싸맸다. 믿음직하게 해결사가 되어줬다면 좋았으련만, 나는 그 분야에선 모든 게 영 남루했기에, 다만 그 불안을 들어주고 같이 쓸어내리며 곁을 지켜주는 게 고작이었다. 그리고 그 처음의 날. 앞에 나선 너를 두고, 나는 최대한 인자한 웃음을 머금어 두고 참으며, 언제 눈을 맞추더라도 네게,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또 보이도록 갖추어 두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머금은 웃음을 유지하는 게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널 보고 있었으니까. 사소한 실수, 어색한 처리는 종종, 하지만 있을법한. 그래도 그때마다 싱겁고 쑥스러운 눈웃음을 띄며 나와 마주친 너는 또, 그대로도 사랑스러웠다. 마스크 안에 어떤 표정이 감추어져 있을지 다 보이는 것도 착각은 아니었을 터다. 그렇게 끝났다. 머물다 휘발된 모든 아쉬움은, 충분히 '처음이니까' 라며 참작할 수 있는 범위 내, 잘했다. 그 이후 수순도 지나가고,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마주친 너의 눈은, 마스크 옆으로도 엿보이는, 상기된 볼 위에서 눈짓을 던졌다. 공원. 다시 만난 너는 돌계단에 털썩 주저앉으며, 마스크를 턱에 걸치곤 숨을 크게 몰아쉰다. 곧이어 아까 그 순간순간 피고 진 느낌과 생각을 두서없이 쏟아내며, 때로는 탄식을, 때로는 까르르 웃음을 뿜어낸다. 그렇게 잔뜩 내놓고서야 다시 한번, 후---. 긴장이 풀려 기진맥진하면서도 잔잔히 키득대는 네가 또 사랑스럽다. 어째 설까, 나도 그를 따라, 숨을 조금 크게 내놓는다. 그리고 한 동안 서로 할 말이 없어, 앞에서 피어나는 분수를 애꿎게 바라보았다. 9시 언저리의 늦은 저녁, 우거진 나무 사이, 조금은 습한 공기. 돌계단에 붙어 앉은 그들은 생각보다 더 가까웠다. 티 나지 않게 슬쩍 떨어질까 싶다가도, 그러다 자칫 지금을 깨버리긴 싫어, 그대로 머무를 뿐. 느껴지는, 내 것이 아닌 체온에, 두근대고도 천연한 미소를 긋고 있는 자신을 슬며시 가다듬는다. 은은한 윤을 내는 저 위의 달, 그 빛 아래 두 사람, 그리고 하나의 그림자. 분수는 연거푸 피어오르다 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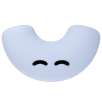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