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1.14 - 사이의 가치 폭닥한 이불속에서 두 발 꼼지락 거리다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간질거리는 햇살에 눈을 비볐다. 중력을 거슬러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켜 세웠다. 엉키고 떡져 위로 부풀어 오른 머리, 그리고 볼 한쪽에는 깊게 패인 자국이 선명했다. 눈앞머리에 매달린 노르스름한 우박을 툭툭 털어내고 언제 세탁했는지 모를 애착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밖으로 나왔다. 쌀쌀한 바람에 양 어깨는 움츠러들었지만 나긋한 햇빛의 목소리에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다. 왼편에는 그 따뜻함을 주워 담아 흘러 내려가는 하천이 보였고 오른편엔 일렁이는 빛에 살랑이며 웃음 짓는 나뭇잎과 곧게 뻗은 나무들도 보였다. 자로 잰 듯 한 뼘을 사이에 두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떨어져 있으면 외로울 텐데...' 쓸쓸한 거리를 메워주려 한 뼘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나무를 옮겨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눈에 보이는 가까움을 기쁘게 여기면 엉켜버린 가지와 떨어지는 열매들을 보며 괴로워할 나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치고 아프게 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까운 듯 멀지 않은 간격이 소중했다. 무성한 숲을 바라볼 때면 저 너머로 물들어가는 풀빛 짙은 푸르름을 볼 수 있지만 실상 그 빛깔은 각기 다른 나무들이 각자의 거리를 지켜낼 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다. 질서의 조화가 빚어낸 눈부신 장면이었던 것이다.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쉬이 기댈 수 있는 가까움은 설탕같이 단 내음이 나지만 편안함에 녹아버린 설탕은 썩어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털어내지 않고 가까이만 붙여두면 오히려 생채기를 낼 수 있음을 알아채야만 한다. 고로 나는 나의 영역에서, 그대는 그대의 영역에서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지켜내고 상대의 것은 섣불리 넘지 않아야 한다. 기다리고 또 바라볼 줄 알아야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숲처럼. 적당한 사이를 두어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며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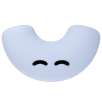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