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1.13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3화 ‘공황장애’ 이야기 中 나 송유찬, 실은 아픈 베테랑이었다. 엄마의 고귀한 유전자덕인지 공부도 지지리 안 했음에도 대학이란 데를 나도 갔더랬다. 또 웬걸, 신이 에너지를 내게 쏟아부었나 대기업 S사에도 떡 하니 붙어버렸다. 엄마 아빠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팡파레를 울렸고 상다리 휘어지게 잔치를 벌였다. “우리 첫째 아들 역시 해낼 줄 알았네”, “S사 합격 비결 옆집 미연이네가 과외해 달라더라” 요란법석을 떨었다. 부담스럽게시리. 웃프게도 싫지만은 않았다. “에이,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겸손 떨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뒤돌아서서는 승리감에 취한 입꼬리가 씰룩거리기도 했다.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뿌듯했었나 보다. 어쨌건 S사에 무사히 입사해 나름 선방하며 다녔다. 밤낮 고생하며 기획한 프로젝트가 성공했던 날도, 몇 억대의 수주를 혼자 힘으로 성공시켰던 날도 있었으니 말이다. 여기저기에서 새어 나오는 칭찬과 선망의 눈빛이 나를 가슴설레게 했다.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냐 물으면 해내겠다 했고, 도와달라 말하면 내 온 에너지를 다 바쳐 힘이 되곤 했다. 밥 한 숟가락 뜰 힘조차 없는 순간이 매일 같이 반복되어도 옥상에서 담배 태우시던 부장님이 환한 미소로 어깨 한쪽 툭툭 치며 ‘덕분이다’ 하실 때 소름 끼치도록 좋았다. 또 ‘너는 내 본보기다’라 우러러보는 동기들의 부러운 시선들이 또 행복했다. 그렇게 그들의 눈에 담기는 행복에 점점 취해갔다. 이런 요상한 자극에 거하게 취해버린 나는 3년째가 될 무렵 무릎 꿇고 말았다. 능력치는 하늘을 뚫어버릴 듯 고공행진 했지만 나의 온 신경 회로가 꽉 막혀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너만 믿는다, 대단하다, 기대하고 있다.’와 같이 설탕 떡칠된 말. 그리고 ‘한 번만 도와줘, 알려줘.’와 같은 애절한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나의 목에 쇠 줄을 채웠다. 그렇게 무거운 목줄을 차고 매일을 이겨냈다. 삶은 안중에 없는 채로. 혹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 전전긍긍했다. 마음 편히 퇴근해 잠을 자기도 어려웠다. ‘이번만 고생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회복하려는 찰나 일거리는 물 밀듯이 밀려왔다. 이 목줄의 끝에는 부장님의 할 일, 이사님의 심부름, 동기의 SOS, 엄마아빠의 기대감 등이 더미처럼 쌓여 묶여있었다. 그 할 일 더미는 나날이 무거워져 갔고, 내 목줄을 더 아래로 끌어당겼다. 고개를 들 수 없었고 허리를 펼 수조차 없었다. 기도는 점점 막혀갔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괜찮은 줄 알았다. 아니 괜찮아질 거라 굳게 믿고 싶었다. 계속해서 조여 오는 이 쇠 줄이 나를 숨 막히게 했고 끊어지지도 않았다. 어지럽고도 아찔했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 그럼에도 문제없다는 듯 웃음을 내보였지만 잠시라도 바람 쐬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다. 손과 발은 부르르 떨렸고 등줄기의 식은땀 역시 마를 날이 없었다. 화장실 마지막 칸 벽에 뚫려있는 손바닥만 한 유리창이 그나마 나의 숨구멍이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시도 때도 없는 나의 빈자리를 눈치채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쓰레기 같은 상상력과 또 누군가의 거친 입담이 더해지니 나는 한순간에 ‘거만한 놈’이 되어있었다. 지하 바닥으로 떨어지는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쿵 소리를 내며 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로부터 1년이 후 나는 엄마아빠 품 속에 안겨 치킨집 아들내미가 되었다. 바쁠 때를 제외하곤 꽤 행복했다. 배달이라는 막중한 임무만 완수하기만 하면 되는 까닭이었다. 전에는 기름에 절여진 닭다리 냄새가 역하기만 했는데, 숨이 쉬어지니 이 치킨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였나 싶다. 달빛 한점 없는 어느 날 X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기가 가게를 찾았다. 칼주름 잡힌 정장 차림에 목에 버젓이 걸린 파란 사원증,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와 말투. 아니길 바랐지만 신은 매정하기 짝이 없었다. 애써 무덤덤한 척하며 당차게 인사했고, 근황을 나눌 새 없이 재빨리 메뉴판을 건네며 입을 막아버렸다. 더 이상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기 끔찍이도 싫어서였다. 그 자리를 무사히 벗어나 밖으로 나왔다. 눈을 질끈 감고 찬 바람을 억지로 코에 쑤셔 넣었지만 어느새 뒷목이 서늘해지며 뻣뻣해졌다. 녹슨 쇠 줄이 또다시 목을 감쌌다. 심장 박동소리가 고막을 강타했고 온몸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 눈앞이 점점 흐려지다 깜깜해졌다. 가슴은 불덩이가 되어 쿵쾅거렸고 터지기 일보직전이었다. 목이 타올라 숨을 헐떡거리며 다리가 떨렸다. 제발 누가 나 좀 도와줘요, 제발. 그렇게 벽 잡고 주저앉아 소리를 토해냈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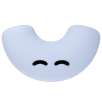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