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마 건축물에서 배우는 탄탄한 조직문화
“바닷물, 생석회와 함께 로만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높인 주요 재료는 무엇일까?”
지난 주말, 채널A <브레인 아카데미> 재방송에서 나온 퀴즈다.
다양한 오답이 오가는 가운데 배우 윤소희 씨가 조심스럽게 외쳤다. “화산재?”
정답이었다.
놀라웠다.
2천 년을 버틴 고대 로마 건축물의 내구성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철근이나 벽돌이 아닌
바닷물과 화산재, 석회라는 조합에서 비롯되었다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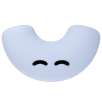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원티드에 가입해 주세요.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10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