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人事萬史 : 리더는 꼭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나?
[ 만 가지 역사 속 인사이야기, 人事萬史 ]
리가 ‘삼국지’로 익히 알고 있는 2세기 후반의 중국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이는 한나라의 영제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신분으로 직접 매관매직을 행하며, 십상시로 대표되는 환관과 하진으로 대표되는 외척을 동시에 활용하여 강력한 황권을 구축하였습니다. 흔히 후한의 영제를 나약하고 허수아비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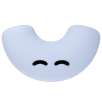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원티드에 가입해 주세요.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