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록: 가을
미지 출처 : Pinterest
쨍한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후덥지근한 날들의 연속, 역설적이게도 그 붉은 뙤약볕 아래에서 저마다의 푸르름을 머금고 무섭도록 자라나는 식물들, 그리고 어떤 날이면 먹구름을 잔뜩 몰고 와서는 대차게 빗줄기를 뿜어내는 하늘을 품었던 계절 '여름'을 두고 혹자들은 흔히 '여름이었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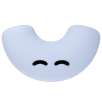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원티드에 가입해 주세요.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