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Data의 시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Tech 보다 Domain, 문제의 본질을 바라봐야...
- 2024년 하이파이브 2일 차 개발자 데이에서 한기용 대표님 강의에서 재미있는 농담을 들었는데 주위에서는 다들 아는 유머였다.
Gen AI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많은 젊은 개발자들이 Gen AI로부터 직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좌충우돌하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들어보면 다들 "Gen AI의 시대에 무엇을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한다고 한다.
비단 개발자만의 우스개는 아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뭐든지 학습으로 닥쳐올 문제를 해결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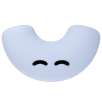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원티드에 가입해 주세요.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5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