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데

“야, DT가 뭐냐? 드라이브 스루 Drive Thru 말하는 거야?”
처음에 DT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다.
“아니, 그게 아니고 Digital Transformation이 뭐냐면... 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말 그대로 Digital과 Transformation의 합성어다.
그런데 이미 디지털화 Digitaliz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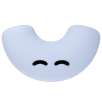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원티드에 가입해 주세요.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