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안 될 것을 대하는 자세 (Feat. 소통을 바라보다)

>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장에 팔러 갑니다. 당나귀를 그냥 끌고 갔더니 안 타고 간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아버지가 탔더니 매정한 아버지라 하고, 아들이 탔더니 불효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탔더니 나귀를 혹사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메고 갑니다. 그러다가 개울 앞을 지나는데 매달려 있던 당나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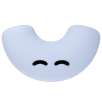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원티드에 가입해 주세요.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