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잘 입는 사람이란?'(5) 제대로 따라 입는 사람

나는 패션을 공부한 적도 없고 업계에서 커리어를 쌓은 적도 없다. 그저 옷을 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다. 어쩌다 보니 그런 내가 남의 패션 스타일링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옷 입는 감각을 타고나지 않았다. 20대 시절 사진 속 내 모습은 패션 흑역사 그 자체였으니까.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 대부분의 이유가 너무 과한 옷차림이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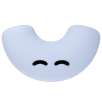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원티드에 가입해 주세요.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