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퇴사'에 대한 생각 (회사 측면)

사의 여러 기능 중에 '인사' 부분만큼 보수적인 것도 없다. 가장 민감한 사람을 다루는 부서로서 경영진의 직속 부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탓이다. 그렇다 보니 혁신보다는 단기 대응에 치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전략 부서나 재무 부서에게 전략적 이슈에 있어 주도권을 뺏기거나 지휘 받는 현상도 적지 않다) 그렇다보니 최근 인사 관련 이슈 대응에서도 주도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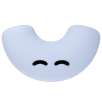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원티드에 가입해 주세요.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