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조직과 개인의 조건 - 똘레랑스(관용)

청명한 하늘 바람이 얼굴을 날 서게 내려칠 때면 살아 있음을 느낀다. 오감을 통해 전해 오는 감각의 자극이 크면 클수록 나는 살아 있음을 느낀다. 고통도 그중 하나이고 기쁨도 그중 하나이다. 고통과 가쁨은 정 반대의 감정으로 고통은 피해야 할 것, 기쁨은 추구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지만 매우 단순한 생각 파편이다. 기쁨은 고통이 있기에, 고통은 기쁨이 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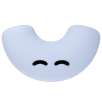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원티드에 가입해 주세요.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