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간 생일같은 매일
연말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객님의 사이트가 11월 22일 만료됩니다. 만료 후에는 사이트 접속이 제한되므로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2년 전, 한 회사에서 가을 끝 겨울의 시작에 조직 내부의 박수와 함께 퍼블리싱된 사내 조직문화 블로그 트렌버스데이가 떠올랐습니다. 아련한 추억이기도, 또 애증이기도 한 그 블로그는 또한 정확히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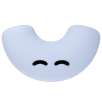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원티드에 가입해 주세요.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0
0

